강연 주제
- 우리는 역사에 빚이 있다
-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소통·가치 합의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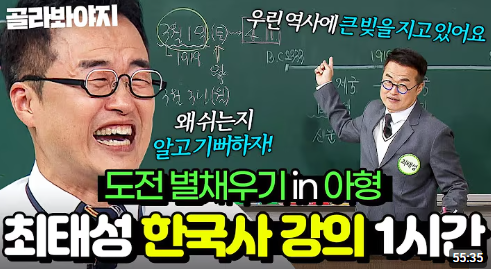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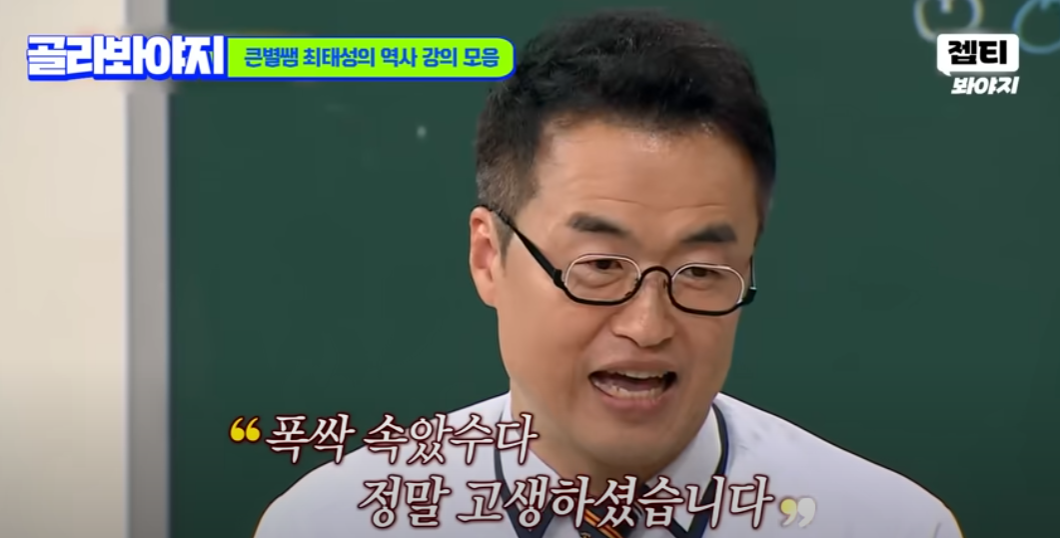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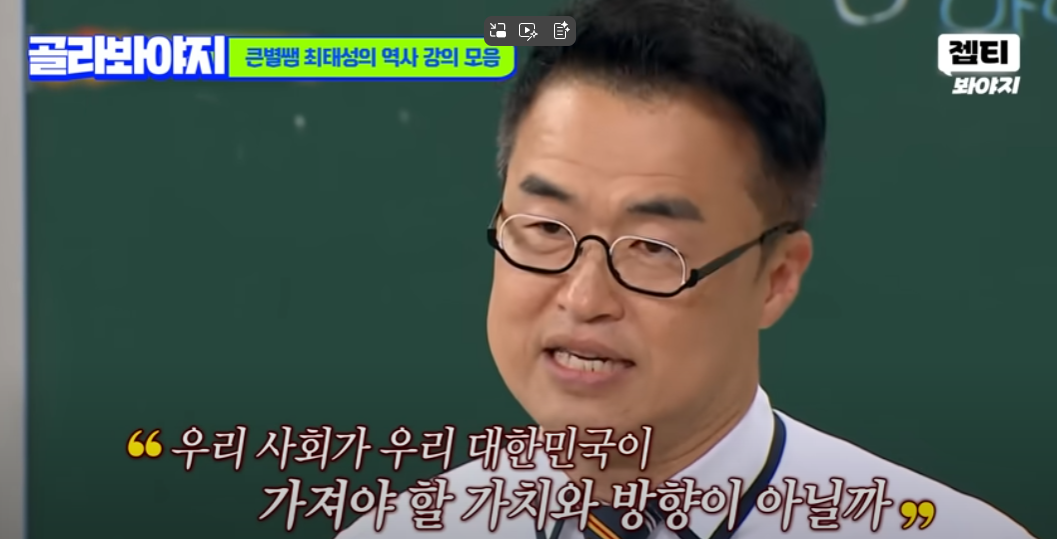
안녕하세요 강연자 섭외 전문기업 더공감입니다.
오늘은 역사 교육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내는 강연자,
최태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강의는 교과서의 연표를 넘어
사람의 이야기와 현재의 의미를 연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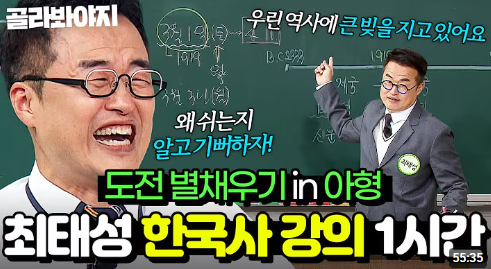
역사를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현장을 울리고,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끌어내는 강연.
기관·기업·학교·지자체에서
꾸준히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역사 특강일까요?
우리는 매일 ‘지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대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선택이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는 바로
그 ‘연결’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거울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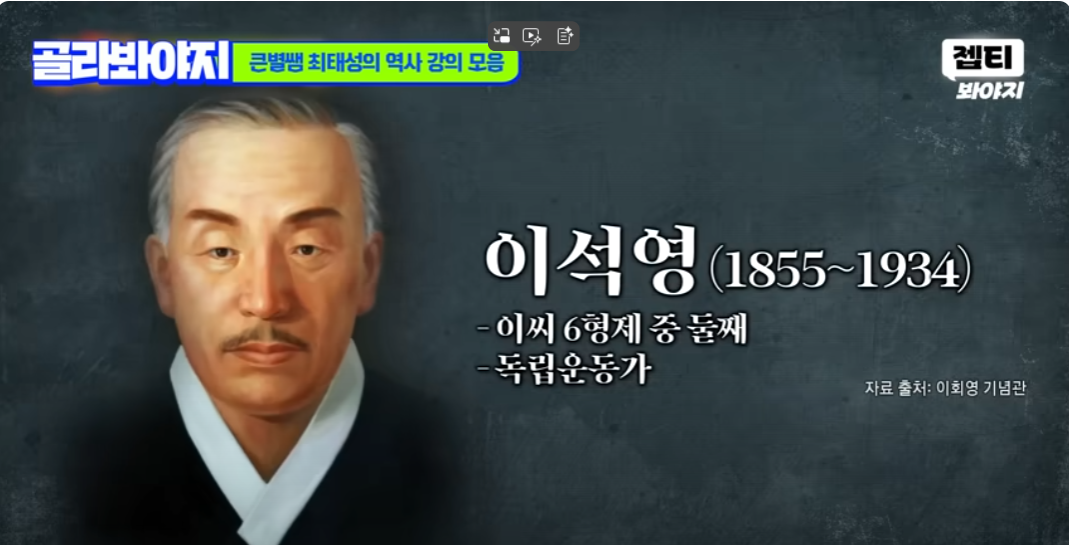
잊힌 독립운동가 이석영 이야기
남양주 일대를 비롯한 토지와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의 기반을 마련한 집안.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는 결단으로
모든 것을 바친 이석영 선생의 삶.
굶주림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는
이 한 인물의 서사가 오늘의 시민 의식과
어떻게 맞닿는지를 차분하게 묻습니다.

3·1운동이 바꾼 ‘호칭’의 변화
왕국의 ‘백성’에서, **민국의 ‘국민’**으로.
1919년의 만세는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국적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탄생일(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에 담긴 의미가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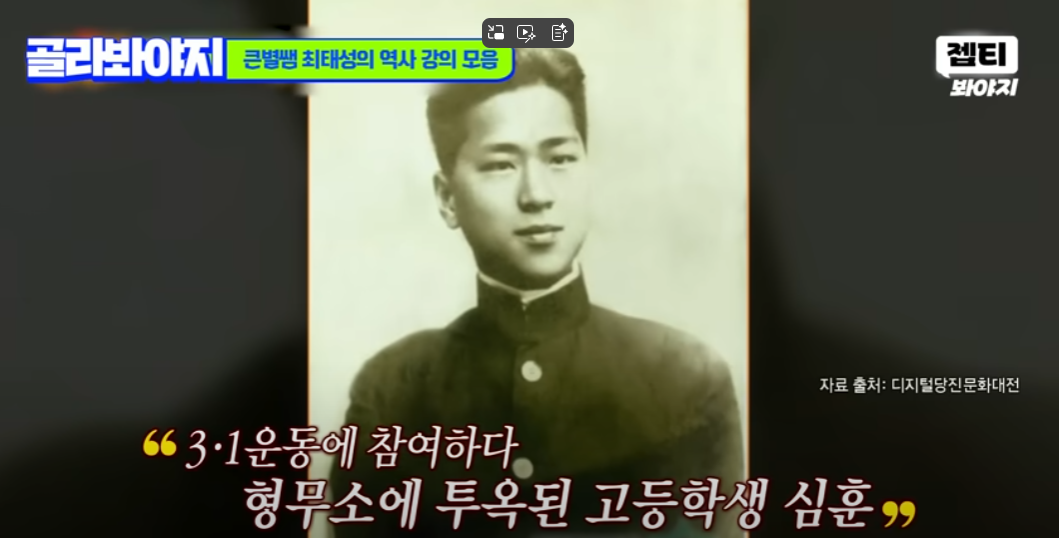
서대문형무소의 여름
심훈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 속 구절처럼,
달궈진 벽돌과 끓는 똥통,
벼룩과 빈대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눈부신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뉘우침보다 결심을 남긴 청년들의 목소리,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복원합니다.

이육사의 ‘꽃’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때에도
오히려 꽃은 밝게 핀다.”
17차례 투옥의 세월을 견뎌낸 시인의 문장을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시민의 실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와이 이민과 ‘만세’의 기억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난 1세대,
사진 한 장에 운명을 걸었던 사진신부,
그리고 독립자금과 교육기금을 모아 보낸
재외동포들의 연대.
‘인천’과 ‘하와이’를 잇는 ‘인하’의 이름처럼,
연결의 역사를 오늘의 과제로 불러옵니다.
미주 사회에서 울려 퍼진 건배사 ‘만세’ 속 기억은
역사가 과거가 아닌 ‘지금을 움직이는 감정의 지층’임을 일깨웁니다.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는
역사는 기억의 학문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된 그의 강의는
청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묻게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역사를 현재로 불러오고,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